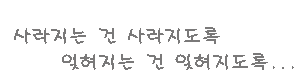존재
뭐 어때../밤에 쓰는 편지 2008. 11. 1. 11:18 |특별히 사춘기라는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정도로
딱히 특별했던 기간이 없었던 것 같다.
언제였을까?
반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아이에서
갑자기 말이 많아졌던 국민학교 6학년?
일년사이 8센티를 컸던 중학교2학년?
한달이 넘는 방학기간 내내 소집일 딱 하루 외출하고
단 한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칩거했던 고1?
중학교1학년때
저녁에 많이 울었다.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그래서 내 아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긴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래서 식구들을....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더 볼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은 밤동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날 컴컴한 방에 누워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다.
그때 였던 것 같다.
나에게 죽음이란 '더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내가 눈물을 흘린건 '죽음'이란 말이 주는 뉘앙스보다는
그 소멸로 인해 파생되는 '더 이상 볼 수 없음'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이사를 갈 때에도 집의 먼지...서랍속의 죽은 벌레까지
모두 챙겼다. 내 근처의 존재들이니까.
그 존재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볼 수 없음'이 되니까.
-----------------------------------------------
싸이에 4년 전에 썼던 글이다.
중학교 때에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 있어 '존재'는 여전히 슬프다.
딱히 특별했던 기간이 없었던 것 같다.
언제였을까?
반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아이에서
갑자기 말이 많아졌던 국민학교 6학년?
일년사이 8센티를 컸던 중학교2학년?
한달이 넘는 방학기간 내내 소집일 딱 하루 외출하고
단 한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칩거했던 고1?
중학교1학년때
저녁에 많이 울었다.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그래서 내 아는 사람들이 죽는다면.
긴 시간이 흘러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래서 식구들을....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더 볼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은 밤동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날 컴컴한 방에 누워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다.
그때 였던 것 같다.
나에게 죽음이란 '더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내가 눈물을 흘린건 '죽음'이란 말이 주는 뉘앙스보다는
그 소멸로 인해 파생되는 '더 이상 볼 수 없음'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이사를 갈 때에도 집의 먼지...서랍속의 죽은 벌레까지
모두 챙겼다. 내 근처의 존재들이니까.
그 존재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볼 수 없음'이 되니까.
-----------------------------------------------
원래 없던것은 계속 없어도 슬프지 않다.
존재하던 것의 소멸은 슬픔을 동반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소멸을 향해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슬프다.
-----------------------------------------------존재하던 것의 소멸은 슬픔을 동반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소멸을 향해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슬프다.
싸이에 4년 전에 썼던 글이다.
중학교 때에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 있어 '존재'는 여전히 슬프다.
'뭐 어때.. > 밤에 쓰는 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통을 보내며... (0) | 2009.06.22 |
|---|---|
| 2009년의 우리들 - 브로콜리 너마저 (0) | 2009.02.25 |
|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4) | 200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