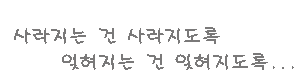최악의 막장드라마 '너는 내 운명'
뭐 어때.. 2009. 1. 8. 17:08 |막장 어워드 같은게 있다면 이견없는 최고의 막장으로 등극할 드라마다.
이거 쓰는 작가란 인간...글 쓰는 이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양반이다.
PD라는 양반은 '일일극의 특성상 통속성은 어쩔수 없다'라고 항변 했다는데
지랄 같은 소리다. 언제부터 '막장'과 '통속성'이 같은 단어가 되었을까.
제발 내용 전개를 위한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맨날 반복되는 우연에 실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황묘사....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
입양한 딸이 알고보니 친딸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더군다나 그 딸의 안구를
기증받고, 그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보니 사촌과도 사랑하고, 그 사촌은
나중에 죽은 친딸의 애인이었던 남자와 사랑하고.........아 뭐냐 대체 이거.
극히 일부만 써놔도 개막장 스럽다.
그래 이런 상황설정은 일일극의 특성상 그 어쩔수 없다는 통속성이라 봐주자.
이 미친 드라마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여부를 확인할때 화장실에서 오줌 받아서
약국에서 파는 테스터기 담근다 -_-
이런 말도 안되는 설정을 태연하게 끌고 나간다.
그렇게 상황전개에 대해 고민하기가 귀찮냐??
시어머니가 이불빨라고 그랬다고 엄동설한에 고무다라이 내와서 밖에서 찬물에
발 담그고 빠는 건 또 대체 무슨 설정이냐.
친엄마 백혈병에 시어머니도 백혈병, 백혈병이 언제부터 전염병이었냐.
그 어렵다는 골수일치도 벌써 4명이나 일치한다. 그것도 친인척들 중에서만.
분명 '그럼 안 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
그래 안 보면 된다.
근데 그 시간대에 퇴근해서 밥먹고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앉아 식사하면서
티비를 틀면 다른 채널 달리 볼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보던 채널에 대한 충성심을 더해 욕을 하면서도 보게 되지.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해물마냥 살살 긁어대는 통에 '아휴 빌어먹을 드라마'
하면서도 보게 되는 거지.
PD나 작가라는 망나니는 높은 시청율에 진정 행복한지 모르겠다.
근데 길바닥에 누가 똥 싸질러놔도 사람들 모두 지나가며 한번씩 본다.
이 빌어먹을 드라마 누군가 길바닥에 싸질러 놓은 '똥덩어리'에 다름아니다.
포르노보다 아주 유해하다.
'뭐 어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 공화국 (0) | 2010.03.24 |
|---|---|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0) | 2009.03.26 |